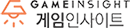‘해외 장거리 취재를 좋아하는 이들도 있을까...’
종종 게임쇼나 대회 때문에 해외 취재를 가야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한다.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이런 생각은 더욱 강해진다. "남들이 들으면 '배가 많이 부르신가 봅니다?'라고 말 하겠네..." 라는 자기반성이 뒤따르지만 불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장시간 비행기에 꼼짝 못 하고 앉아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평소 어머니에게 '저게 사람이야 카페트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사나이인 나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비행기 안의 건조한 공기와 난기류를 만나 이따금 크게 요동치는 비행기 역시 불편하다. 나는 한 숨도 못 자겠는데 옆자리 사람은 어쩜 저리 비행기에서도 잘 자는지 부러울 따름이다.
이렇게 도착하면 이제는 시차적응을 할 차례다. 나는 시차적응 기간에 백이면 백 배탈을 앓고 몸살에 걸린다. 그 몸을 이끌고 일을 하러 간다. 남들 모두 축제를 즐기고 있는 곳에서 일이라니.
학교 다닐 때에는 남들 다 놀 때 공부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인 줄 알았고,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 거라고 당시에는 생각도 못 했다.
취재를 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게 정확하겠지만, 이미 늦은 일이다. 적당히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몸을 베베 꼬면서 온 덕분에 심사도 뒤틀렸으니 블리즈컨 현장 입구가 퀘스트 수행하러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던전 입구로 보일 지경이다.
투덜거림이 길었다. 하지만 이렇게 긴 문장을 할애하면서 투덜거린 이유는 이 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블리즈컨은 올 가치가 있는 행사입니다"라고 말이다.
어디 홍보 팜플렛에나 적일만한 문구를 기사에 쓴다는 것은 지양해야... 아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기레기' 소리 듣기 딱 좋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기사에는 사실을 써야하고, 저 이야기는 사실이니까.
개막 이전부터 행사가 진행되는 애너하임 컨벤션센터 앞은 입장을 기다리는 수천명의 인파로 북적이고, 문이 열리자 함성을 울리며 빠른 걸음으로 애너하임 컨벤션센터로 몰려온다. 환호를 지르는 사람들. 펄쩍펄쩍 뛰는 거구의 백인. 부모와 함께 온 아이, 휠체어를 탄 이들, 큰 개를 데리고 온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같이 얼굴에 두근거림을 감추지 못 한다.
'두근거림'은 블리즈컨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다. 이 사람들은 경품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모델의 사진을 찍으러 온 사람들도 아니다. 순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개발자들이 자신이 개발 중인 게임에 대한 청사진을 전하는 것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유저들의 이러한 두근거림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키는 법을 알고 있는 듯 하다.
오버워치의 지금까지 행보를 정리하는 특별 영상 상영 중, 해커라는 캐릭터 콘셉트에 맞게 메인 스테이지의 대형 디스플레이에 노이즈를 일으키고 영상을 끊어버리고 솜브라의 모습을 공개하고, 자사가 준비 중인 새로운 e스포츠 리그 계획을 거창한 소개 문구 없이 자연스럽게 꺼내거나, 관람객들을 자연스럽게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영웅처럼 대하며 환호를 이끄는 모습을 보면 말이다.
아쉬운 점이 없던 것은 아니다. 블리즈컨 10주년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공개된 내용들은 임팩트가 다소 부족한 것 같다고 여길 수도 있었다. 신작 혹은 신규 확장팩에 대한 소식은 하스스톤의 새로운 확장팩 정도에 그쳤다. 물론 하나 같이 게임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10주년에 걸맞는 좀 더 굵직한 소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기자라는 입장 때문에 게임쇼의 참가자가 아닌 관찰자의 관점에서 행사를 바라보게 된다. 아쉬운 점도 있었고 기대에 미치지 못 한 점도 분명 있었다. 그럼에도 블리즈컨 2016 현장의 열기는 나에게 충분히 와 닿았다. 와 닿은 정도가 아니라 공개되는 정보를 접하고 마음 속으로 '오!' 하는 감탄을 내뱉기도 했다. 입장할 때의 삐딱한 모습을 생각하면 꽤나 극적인 변화다.
시차적응에 실패한 상태로 현장에서 빡빡하게 잡힌 인터뷰 일정을 소화하고 나면 출구를 나설 때 즈음에 피로가 밀려온다. 그래도 입장할 때의 그 짜증스러움은 이미 물러갔다.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 '아. 디아블로3나 다시 해볼까. 강령술사 해보고 싶던데...'
평범한 30대, 게임에 조금은 질린 아저씨가 다시금 게임에 두근거리는 게이머로 돌아가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