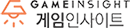지난 11월 20일 막을 내린 게임쇼 지스타 2016에서 넥슨은 자사에서 개발한 인디게임 애프터디엔드와 이블팩토리를 선보였다. 매년 지스타에 참가하는 넥슨이 예년과는 다소 다른 성격의 게임을 공개했다는 것만으로도 국내 게임업계는 술렁였다.
넥슨이 인디게임을 선보였다는 말은 인디게임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생각하면 다소 모순적인 면이 있다. 본래 인디게임(Indie Game, Independent Game)이라는 말이 자본가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 제작된 게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형 게임사인 넥슨의 주도하에선 사전적 의미의 인디게임이 나올 수는 없다.
때문에 넥슨이 이번 지스타에 선보인 인디게임들은 상술한 의미보다는 '매출 욕심을 내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는 뜻과 '대작이 아닌 작은 규모로 개발된 게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사실 넥슨 정도의 규모를 지닌 기업이 매출에 큰 욕심을 내지 않는 게임을 선보인다는 것만으로도 '도전적인 행보'라는 평가를 보낼 수 있는 일이다.
사실 지스타 현장에서 직접 즐겨본 애프터디앤드, 이블팩토리는 비디오게임이나 스팀 플랫폼을 통해 인디게임을 자주 접해본 이들에게는 친숙한 모습의 게임일 수 있다. 하지만 애프터디앤드와 이블팩토리는 국내 모바일게임 실정을 감안하면 꽤나 실험적인 면이 돋보이는 게임이다.
이제는 당연시 되는 부분유료화 모델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는 느린 템포의 3D 퍼즐, 세로 탑뷰 시점의 아케이드 슈터 장르를 내세웠다는 점은 현 게임시장의 흐름에 반하는 행보다. 추후 비디오게임이나 스팀 등의 플랫폼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새롭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일까? 지스타 현장에서 이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든 생각이 있다. '이 게임들을 무료로 시장에 배포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게임의 완성도가 유료게임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든 생각은 아니다. 현재 넥슨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장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임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택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의견이다.
종종 무리한 과금 모델을 선보여서 유저들에게 '돈슨'이라는 오명을 자처한 넥슨은 수년 전부터 이러한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장에서 주류 장르로 인정받지 못 하는 게임을 지스타에 선보이고, '인디게임에 신경을 쓰겠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파격적인 방식이어야 이러한 노력이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워낙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박힌 기업이기에 인디게임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마저 '이제는 인디게임으로도 돈 벌겠다는 거냐'는 비아냥을 살 수 있다. (실제로 지스타에서 애프터디엔드, 이블팩토리 등의 게임이 공개된 이후 이러한 의견을 보이는 이들이 있었다)
정말로 넥슨이 인디게임 저변을 확대하고, 인디게임에 도전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디게임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적어도 수익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겨지겠지만, 기업들이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비용을 들인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리한 주장은 아닐런지도 모르겠다.
또한 매출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더욱 다양한 아이디어를 부담 없이 공유할 수 있고, 넥슨을 통해 완전히 인디게임이 출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사내 개발자들의 개발역량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개발사로 다시 설 것이라고 천명한 넥슨에게는 무형적인 재산이 될 수 있다.
넥슨이 인디게임 무료화 노선을 걸을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생각을 해 보는 것은 국내 게임시장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자본이 필요하며, 결국 몇몇 대형 게임사가 이를 주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연 넥슨의 인디게임 전략은 어떤 형태로 뻗어나갈 것인지. 넥슨의 행보를 주목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