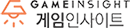게이머 입장에서 혹은 기자 입장에서 게임을 즐기다가 종종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런 마음은 '아. 이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해보면 좋을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 들고는 한다.
모바일 인디 게임을 즐기다가 숨겨진 보석 같은 게임을 발견했을 때는 이러한 아쉬움이 덜하다. 스마트폰이 없는 이는 드무니, 부담 없이 플레이를 권할 수 있으며 상대방도 쉽게 게임을 다운로드 해서 게임을 체험할 수 있다.
하지만 권하고 싶은, 다른 이들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 게임이 비디오게임인 경우에는 이런 아쉬움이 더욱 커진다. 스마트폰과는 달리 비디오게임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그 기기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는 기기라면 더욱 그렇다.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Breathe of the wild)은 후자의 경우라 할 수 있다. 닌텐도 Wii U와 스위치로 출시된 이 게임은 뛰어난 자유도를 강조하며 오픈월드 장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즉, 전에 없던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게임이라는 이야기다.
본 기자에게 오픈월드 개념은 흥미로움, 자유로움보다는 번거로움의 의미가 크다. 넓은 맵에서 이것저것 할 것이 많다는 식으로 풀이되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 멀리까지 가야하는구나. 언제 갔다오냐'라는 의미가 더욱 강하게 와닿기 때문이다. 사실상 멀리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반복적으로 강요하니 게임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여기에 오픈월드 게임의 이동과정이 썩 자유로운 자유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목적지까지 어느 도로를 타고 갈 것인지, 어떤 차를 타고 갈 것인지 정도의 선택지만 유저에게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에서 이동은 게임을 즐기는 또 하나의 목적이다. 이동하는 과정에 바위를 들추고, 나무 그늘을 살펴서 채집을 하고,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주변 지형지물을 확인할 수 있다. 맵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형정보만 제공할 뿐, NPC나 오브젝트의 위치까지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유저는 자신의 눈으로 주변 지형을 계속 확인하면서 목적지로 나아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적을 찾기도 하고, 유적에서 퍼즐을 수행해 능력치를 높일 수도 있다. 유적에 입장하는 과정도 다양해서 그냥 입구가 개방되어 있는 유적 이외에, 게임의 기믹을 활용해서 장애물을 넘어가야 하는 유적도 존재한다.
즉, 이동하는 과정 중에 유저가 끊임없이 상황을 판단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길을 따라 갈 것인지, 암벽등반을 하듯이 산을 넘어 갈 것인지, 높은 곳에 올라가 글라이더를 타고 산과 산을 넘어 갈 것인지. 아니면 안전하게 길을 따라 걸을 것인지, 걸어가는 와중에 말을 포획해서 길들일 것인지 등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유저가 택할 수 있는 방안이 대단히 다양하게 존재한다.
다양한 지형 특성은 유저가 이 세계 속을 모험하는 기분을 더욱 강조한다. 기온은 캐릭터의 행동력에 영향을 주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추운 지역에 주인공이 진입해야 할 때를 예로 들면 이 게임과 여느 오픈월드의 상황 해결 방식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다. 여느 게임 같으면 추운 지역 앞에 퀘스트를 주는 NPC를 배치하고, '이 퀘스트를 수행하면 방한복을 주겠다'라며 퀘스트 수행을 위해 다른 지역에 다녀올 것을 강요할 것이다. 혹은 근처에서 특정 채집물을 일정 수량 이상 확보해서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은는 좀 더 자연스러운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필드에서 채집할 수 있는 열매 중 몸에 열이 나도록 매운 맛이 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나는 유저라면 이를 먹어가면서 추운 지역을 누빌 수 있고, 이 열매를 조합해 요리를 만들어서 다닐 수도 있다. 혹은 한참 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방한복을 이야기하던 NPC가 원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를 가져다주고 방한복을 얻을 수도 있다.
게임 내에선 이에 대한 네비게이션도 제공하지 않는다. '저기 가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라'는 식으로 행동을 몰아가지 않고 유저가 알아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게임 내 이곳저곳에 단서를 남겨두는 식이다. 필드를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이런 단서를 통해 지식을 체득하면, 각종 난관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닌 알아서 하는' 게임이기에 초반에는 다소 막막하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필드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보면 어느사이엔가 이러한 막막함은 호기심으로 바뀐다.
'이렇게 해볼까?' 싶은 마음에 해보면 '어? 정말로 되네?' 하면서 십중팔구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정 행동을 하려면 스킬포인트를 얻어야 하고 스킬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퀘스트를 수행하도록 하는 여느 오픈월드 게임과는 확연이 다르다는 것을 게임 초반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압도적으로 높은 자유도, 그리고 강력한 상호작용으로 유저의 호기심을 끝없이 자극하는 오픈월드와 물리엔진은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을 지탱하는 힘이다.
전투의 질 역시 높은 편이다. 오픈월드 게임, 특히 오픈월드 RPG가 행동의 여지를 넓히는 대신 전투 퀄리티를 놓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을 보면 반가운 부분이다. 몬스터의 지능은 수준급이며, 적을 때리고 유인하고, 공격을 막아내고 약점을 노리는 일련의 과정은 직관적이다. 필드에서 장애물을 공략하는 것만큼이나 적을 공략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등장하는 몬스터의 종류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은 아쉽지만, 게임의 주체가 전투와 파밍이 아닌 이동과 모험, 난관 극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퀘스트 수행을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는 본 기자도 이 게임을 하는 순간 만큼은 이런 생각을 끊이지 않고 했다. "저 언덕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모험을 원하는 유저의 호기심을 끝없이 자극하는 게임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