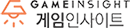‘아날로그’에 대한 욕구는 항상 있어왔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언제나 히트를 쳤고, 스마트폰 유저들은 간혹 이전의 2G 휴대전화를 떠올린다. 게임도 다를 것 없다.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래픽의 게임을 플레이하던 유저들도 가끔 과거의 픽셀 게임을 그리워한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도 과거에 대한 향수는 유저들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화려한 화면이나 막대한 자본이 없어도 플레이어들을 감동시킬 게임을 만들 수 있는가? 여기 그에 대한 답을 건네는 게임이 하나 있다. 로스트 트랙(Lost Tracks)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로스트 트랙(Lost Tracks)’은 덴마크 애니메이션 워크숍에서 제작된 게임으로, 대학생의 졸업 작품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데 성공했다. 무엇이 그렇게 많은 플레이어들을 사로잡았을까?
게임은 한 남학생이 기차에 타면서 시작된다. 제작자의 말에 따르면 그는 20세 초반의 학생으로, 기차 여행을 떠나게 된다. 우리는 그가 어디로 떠날지 알 수 없다.
그저 떠난다. 그는 기차에서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만나지만 말을 걸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 그는 그 순간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은 또 다른 ‘그’로 분리된다. 우리는 그의 여행을 따라가는 대신, 그의 마음의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그’를 찾아 떠나는 마음의 길은 낯설지 않다.
왜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우리도 항상 같은 일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과제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그 답을 찾아 헤맨다. 그리고 게임 속의 남학생은 그 고민을 형상화하여 보여 준다. 플레이어는 단지 분리된 ‘본성’을 찾아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앞선 질문의 첫 번째 해답이다. 게임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 만한, 그리고 어느 세대에나 있어왔던 질문을 게임에서 던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두 질문은 결국 일맥상통한다. 여학생에게 말을 걸고 싶은 ‘분리된 남학생’은 ‘진짜 나’와 다름없다. 어딘가에 가로막히지 않는 본능 그대로다. 플레이어들은 역시 본능적으로 분리된 그를 쫓게 된다. 홀린 듯이 화면을 터치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게임에서는 오직 플레이어의 감각만 존재한다. 플레이어는 가장 원초적인 감각인 오감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임의 챕터는 셋으로 나누어지지만, 플레이어는 이미 화면을 만짐으로써 촉각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화면을 기울여 움직이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온전하게 일상의 감각을 스마트폰까지 끌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
가장 기본적인 감각을 사용하는 만큼 게임 방식은 직관적이다. 첫 번째 챕터는 안개 속에서 빛나는 것을 찾아 누르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뿌옇게 변한 화면에서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해야 한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마음에 있는 촛불을 불어 끄게 된다.
이 게임이 ‘기본적인 것’만을 가지고도 매력적인 이유는 여기 있다. 쉽게 찾을 수 없는 나를 찾는 과정을 시각화시키는 과정에서 플레이어가 일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감각들을 게임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플레이어들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내면을 게임 속 남학생과 함께 되짚어보게 되며, 학생과 대화하게 되는 단순한 결말에 이름에도 감동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많은 유저들의 리뷰에는 짧았지만 마치 단편영화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글이 다수 있다. 본인을 게임에 이입시키기 쉬운 스토리 구조와 진행방식 덕분이다. 오히려 단순함이 몸을 그대로 이용하는 VR게임의 인위적인 느낌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불어 감각적인 화면과 적절한 음악은 플레이어들을 매료시키는 데 충분했다.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게임의 ‘빈 공간’에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자신의 이야기를 채울 수 있게 하느냐가 게임의 완성도를 판가름하는 요소가 된다. 다시 말해, 자본의 부족으로 생기는 빈 공간들을 플레이어들이 직접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Lost Tracks’의 스토리 구조는 기승전결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 오로지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 그리고 끝으로 가는 전개에는 굴곡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플레이어가 자신을 그 공간에 이입함으로써 나름의 스토리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술력을 제압할 수 있게 만든다. Lost Tracks은 플레이어마다 다른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표면상으로는 남학생의 분신을 쫓고 있지만, 결국 내면의 나와 만나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플레이어들은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나와 만나고 온다. 진정 게임 속으로 ‘탈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제목이 시사하는 바 또한 크다. 제목과 게임을 연관 짓자면, 플레이어들은 우리가 잊고 있는 ‘또 다른 나’가 내면에서 걷는 길을 쫓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게임에서 그 길을 올바르게 찾아감으로써 간접적으로 다시 한 번 나를 되찾는다.
현대 사회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되었다. 사람들은 보다 쉽게 스스로를 찾고 싶어 한다. 그런 시대 흐름에 따른다면, 플레이어들이 게임 캐릭터와 함께 본인을 찾아 떠날 수 있게 하는 게임이 ‘Lost Tracks’뿐만이 아니라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시간을 주는 게임들이 더욱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경쟁 구도를 갖추고 있는 게임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사회에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점차 경쟁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고, 사람들은 그런 현실에 지치게 된다. 자연스럽게 게임에서 경쟁이 아닌 휴식을 찾는 사람 또한 늘어난다. 그러한 상황에서 ‘Lost Tracks'과 같은 잔잔한 게임들은 꾸준히 수요층을 늘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