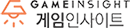테리 길리엄 감독이 오랜만에 SF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일흔 다섯이 넘는 노장이 자신이 가장 잘하는 장르로 돌아온다는 소식은 많은 SF영화 팬들을 한껏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브라질’과 ‘12몽키즈’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비슷비슷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감독이 21세기에 연출한 작품들은, 감독의 역량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영화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프로그래머 코언(크리스토퍼 왈츠)는 거대한 컴퓨터 회사 맨컴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머리는 다 빠지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하죠. 자신을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부르며 사회성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는 과거의 어느 날 걸려왔던, 삶의 진실을 알려줄 목소리가 들리던 전화를 실수로 끊은걸 후회하며 늘 그 전화가 다시 오길 기다립니다. 그 전화를 받기 위해 회사에 자택근무를 허가해줄 것을 계속 요청하죠. 그러던 중, 우연찮게 맨컴의 회장(맷 데이먼)과 마주치고 ‘제로법칙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택근무를 허락받습니다.
불탔던 교회를 개조한 코언의 집 안에서 그는 제로법칙과, 혹은 그의 안에 있는 공허와 씨름하며 매일매일 그의 표현 그대로 죽어갑니다. 그의 마음 속엔 언제나 우주의 끝과 같은 공허가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공허를 증오하거나,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일종의 동반자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으면서도 꾸역꾸역 살아가는 패러독스, 모든것이 결국 제로, 완벽한 0으로 수렴한다는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 미친듯이 일을 하는 패러독스가 그의 인생이죠.
‘제로법칙의 비밀’은 일종의 테리 길리엄 표 종합선물세트 상자입니다. 그의 장기인 화려하고 기괴한 색감과 미술, 정신없고 조잡하여 매력적인 미장센, 말도 안되는 소리를 끊임없이 지껄이는 코믹한 캐릭터들, 꿈속에서 헤매는 것 같이 기괴한 플롯까지, 그에게 바라는걸 대부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감독이 다시 재기에 성공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그의 전작들을 갈아서 새로 반죽하고 덧칠한 것에 다르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무런 발전없이 전작의 매력들을 답습하고 있다고 해도, 그의 세계는 매혹적입니다. 21세기에 연출한 작품들에서 주로 사용하던 CG를 최대한 버리고 과거로 회귀한, 일일이 만들어서 배치한 소품들과 세트는 그것만으로도 영화비가 아깝지 않게 해줍니다. 영화를 위해 디자인된 컴퓨터 인터페이스까지, 영화 안의 모든 것이 참신하고 기발합니다. 여전히 그가 예전에 보여줬던 창의력 안에서 맴돌고 있지만, 언젠간 질릴 순 있더라도 매력이 없다고 하진 못할 겁니다.
주인공 코언 역의 크리스토퍼 왈츠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연기도 일종의 소품이나 마찬가지인 영화이기에 열연을 펼칠 가능성도 적었겠죠. 다른 배우들 역시 마찬가지구요. 우리나라 영화 홍보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포스터에 주연과 같이 올라있는 벤 위쇼는 거의 까메오에 가깝고, 틸다 스윈튼과 맷 데이먼의 경우 그나마 벤 위쇼보단 중요한 역할로 등장합니다. 특히 맨컴 회장으로 나오는 맷 데이먼이 멋진 모습으로 나오는데, 흰색 머리와 딱 떨어지는 수트가 그렇게 잘 어울릴지는 몰랐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는 있지만 사실상 바나나향 우유의 바나나향 처럼 철학향을 첨가한 정도라고 봐야하겠습니다. 하지만 테리 길리엄 영화의 특성상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진 않아도 독특한 영화의 진행 속에서 관객이 새로운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정확한 질문과 답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욱 나열하여 늘어놓고 그 위를 관객들이 유랑하는 사이에 관객 내부에 새로운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것이 의도한 것이었든 그렇지 않았던, 이 노감독은 자신의 장기를 어떻게 발산할 수 있는지는 아는 셈입니다.
그렇게 영화의 이미지에 취해 따라가다 문득 숨을 참게 만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코언이 콜걸 베인슬리(멜라니 티에리)와 가상현실 속에서 해변에 누워 행복해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 너무 이상적으로 표현되어 마치 그 해변에 같이 누워있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프랑스 배우인 밀라니 티에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등장하기도 하구요. 그 외에도, 제로법칙의 계산을 시각화한 인터페이스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는 라디오헤드의 흑역사가 되어버린, Creep을 편곡한 주제가도 좋았습니다.
말하자면 ‘제로법칙의 비밀’은, 완벽한 영화는 아니지만 매력은 넘치는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2014년에 감상한 SF영화 중 벌써 두편(‘그녀’와 ‘제로법칙의 비밀’)이나 오래두고 볼만한 영화가 생겼습니다. 아직(혹은 고작) 네달의 시간이 남았지만, SF영화 팬들에겐 꽤나 풍족한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호경 기자
ginspres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