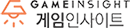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3월, 유비소프트는 뉴욕시를 배경으로 삼은 '톰 클랜시의 더 디비전(이하 더 디비전)'을 정식으로 출시했다.
'더 디비전'은 오픈월드로 구현된 뉴욕시의 사실성과 MMO의 몰입감으로 전 세계 유저들을 매료시켰다. 국내 역시 게임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콘솔은 물론 PC판까지 사람이 몰렸고 업계의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는 등 인기 타이틀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잦은 서버 다운과 접속 불량, 파밍의 한계와 같은 콘텐츠의 오류로 유저들은 점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연달아 터진 핵 프로그램과 쏟아지는 게임 속 버그들은 게임을 이어갈 수 없도록 만들면서 게임은 상승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락했다.
그렇게 '더 디비전'의 생명은 끝이 난줄 알았으나 유비소프트는 지난해 말 콘텐츠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게임의 구조를 바꾸는 대대적인 변경 작업에 돌입했다. 테스트 서버를 열며 다양한 유저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밸런스와 게임의 전체적인 파밍 구조를 바꿔 결국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냈다.
지옥에서 돌아온 '더 디비전'은 다시 유저들의 환영을 받으며 회복세로 돌아섰다. 다시 초기 일일 접속자 수에 근접하는 유저들을 불러 모으는데 성공했으며 연이은 업데이트로 콘텐츠를 확충하고 이제 1주년을 앞두고 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디아블로3' 역시 초기 서버의 불안정함과 콘텐츠의 호불호로 인해 홍역을 겪었다. 하지만 확장팩 출시와 개발진들의 노력으로 다시금 게임에 활력이 돌아왔고 디아블로 시리즈를 당당히 계승하는 타이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디아블로3'가 다시 유저들의 사랑을 받기까지 개발진들은 엄청난 노력을 쏟았다. 기본적인 파밍 플레이의 게임성만 남긴 채 게임의 재미를 해치는 콘텐츠를 과감히 삭제했고 게임의 정상화를 위해 힘썼다.
두 게임의 변화는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다. 게임이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순간 주요 개발진들은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하고 업데이트는 멈추는 등 대부분의 국산 게임들은 유저에게 버려지는 즉시 서비스 종료의 수순을 밟았다.
모바일로 게임시장의 무게추가 기울자 이러한 성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적어도 서비스 1년은 유지했지만 이제 초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3~6개월 만에 게임의 서비스 종료 결정을 내리는 게임사도 등장했다.
콘텐츠의 가치보다 기술의 가치가 우위에 있는 한국 게임시장의 특성은 유저들의 신뢰도 보다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와 이슈에 흥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운에 따라 달라지는 게임의 흥행은 안정성을 위해 기존 게임성을 답습하게 되고 결국 세부 게임성은 퇴보하면서 업계 전체가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
'더 디비전'과 '디아블로3'는 초기에 게임을 종료할 수도 있는 막대한 피해를 봤으나 결국 개발진들의 장인정신으로 게임을 지켜내는 동시에 프랜차이즈의 명성을 살리면서 미래까지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앞선 게임들은 유저들의 신뢰도와 프랜차이즈의 가치, 콘텐츠의 힘을 믿고 개발진들이 주인 정신을 가지며 게임을 살려낸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국내 게임시장 전체가 본받아야 할 부분으로 매출만 중시하는 국내 모바일게임의 방만한 운영이 더욱 아쉬워지고 있다.
한국의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콘텐츠 자체를 살아있게 만드는 개발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실수를 인정하고 게임을 위한, 변해가는 유저들을 더 가까이 살펴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유저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게임이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요행만으로는 더 이상 성공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 게임시장에서 어떤 게임이 훌륭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좋은 서비스를 선보이며 성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