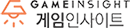일반적으로 게임장애를 떠올리면, 게임중독이 떠오른다. 게임장애를 정신적, 심리적 질환으로 생각해 ‘사람’ 문제로 결부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게임장애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이용할때 발생하는 에러 현상, 불편함과 어려움, 즉 시스템 문제에 써야하는 용어다.
2018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이하 NDC)에서 ‘게임에 매달리는 사람들 –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란 주제로 이락 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교수의 세션이 진행됐다.
이장주 교수는 강연에 앞서 ‘쥐공원 실험’을 소개했다. 쥐를 우리에 가둬 한쪽에는 물을 다른쪽에는 마약을 배치해 무엇을 마시는지 관찰하는 실험이다. 쥐를 혼자 가두면 마약을 마시고 죽었지만, 다수를 넣으면 물을 마시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2달 동악 중독시켰던 쥐를 쥐공원에 넣었더니 마약을 먹지 않는 모습이 관찰됐다.
“사람도 똑같다. 진통제도 마약이지만 중독이 되는가? 마약은 화학적 원인, 진행 과정, 결과 로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떨어져 버티기 위한 적응기재중 하나로 밝혀졌다. 이런 점을 생각하지 않고 처벌하면 겉으로는 합리적이지만 결국은 병리적 현상을 강화시키는 행위다”며 게임에 대한 시사점을 알려줬다. 쥐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공동체 해체로 생긴 우울증을 감당하기 위해 게임에 몰두한다는 것이다.
1996년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인터넷중독이 등장했지만, 지금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 생활전반에 걸쳐서 보편화 됐고,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같은 세계적 기업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을 했다. 인터넷이 비정상적인 것이라면 세상은 정상인 것이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게임이다.
이장주 교수는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시대변화와 관련된 갈등, 가치변화에서 일어나는 논쟁이다.”라며 게임장애가 타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첫 번째는 ‘중독 개념의 혼란’이다. 중독은 신경적 의존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금단 증상이 나타나야 하지만 게임에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게임으로 인해 신경손상과 망상이 일어나 뇌손상이 생긴다고 하지만 뇌가 손상됐다고 증명할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프로게이머는 불구자가 되는 것인가?”
두 번째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데올로기 희생’이라는 점이다. 젊은이의 일탈이 사회를 붕괴 시킬 것이라는 불안으로 ‘게임’을 지목했다는 것이다. 50년대에는 만화, 60~70년대는 락앤롤이 지목됐던 현상과 비슷하다.
세 번째로 ‘사회적 융성‘ 가능성이다. 이장주 교수는 “WHO 게임장애 기준을 반려동물, 종교, 자녀 등과 같은 항목을 넣어도 의미가 통한다. 매력적인 문화산업을 질병산업으로 되는 것이 걱정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4차산업 혁명의 기본이 되는 게임이 혐오의 주인공이 되어 문화 융성 가능성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장주 교수는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문제를 봐야한다. 게임사가 더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도전할만한 새로운 시도를 할 시기이다. 그리고 당당하게 게임장애에 맞서야 한다.”며 게임 회사에 대한 당부를 남겼다.
끝으로 “게임이용에 겪는 것만이 게임장애이며 사람에게 칭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게임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대응할만한 논리를 하나라도 챙겨가길 바란다.”며 강연을 마쳤다.